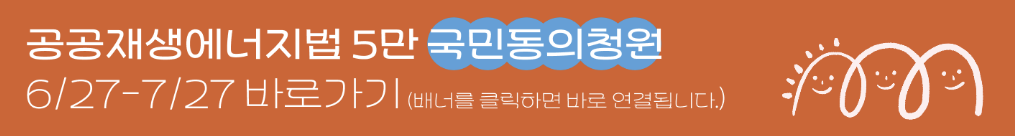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핵심내용
1.5℃와 2℃의 극명한 차이
IPCC 제 5차 보고서가 2℃ 목표에 집중했다면,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했을 때와 2℃로 제한했을 때의 영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단 0.5℃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 극한 기후현상,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 안보, 물 부족, 질병 확산 등에서 현저하게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5℃ 목표 달성의 긴급성과 가능성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45% 감축하고, 2050년 경에는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다.
탄소예산의 중요성
미래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잔여탄소예산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감축 시나리오 제시
1.5℃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배출 경로와 이를 위한 에너지, 토지 이용 등 모든 부문의 대규모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제거기술 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의 연계성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어떻게 연결되며, 기후 행동이 사회적 형평성에 어떤 영향르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 요약
- 지구온난화 1.5℃의 이해
- 인간 활동은 0.8℃에서 1.2℃ 범위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0℃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1.5℃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기후변화 전망, 잠재적 영향 및 관련 위험
- 기후모델 전망은 지역적 기후특성이 현재와 1.5℃ 만큼의 지구온난화 사이, 1.5℃와 2.0℃ 만큼의 지구온난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robust)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에는 육지와 해양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온도 상승, 거주지 대부분에서 극한 고온 현상의 증가, 일부 지역의 호우 증가와 일부 지역의 가뭄 및 강수 부족 가능성의 증가가 포함된다.
- 2100년까지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은 2℃ 보다 1.5℃ 지구온난화 시 약 0.1m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면은 2100년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며, 상승 규모와 속도는 미래 배출 경로에 따라 좌우된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느려지면 군소도서지역, 저지대 연안 및 삼각주 지역의 인간계 및 생태계에서는 더 많은 적응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육지 생물종의 감소 및 멸종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2℃ 보다 1.5℃ 지구온난화에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게 되면 육상, 담수 및 연안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2℃ 상승 시 보다 줄어들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많이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것은 2℃ 온난화 대비 해양 온도 상승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해양 산성화를 완화하고 해양 산소 수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해빙 및 온난한 수역의 산호초 생태계의 최근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5℃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면 결과적으로 해양의 생물다양성, 어업, 생태계 및 이들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부분의 적응 필요성은 2℃에 비해 1.5℃ 지구온난화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광범위한 적응 옵션이 있다. 인간계와 자연계에 대한 적응 및 적응 역량의 한계와 이로 인한 손실이 1.5℃ 지구온난화에서 존재한다. 적응 옵션의 수와 유용성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 1.5℃ 지구온난화에 상응하는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
-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있는 1.5℃ 모델 경로에서, 인간활동에 기인한 전지구적 CO2 순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한다.
-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 탄소배출총량과 같은 산업화 이전 시기 이후로 누적된 인간활동에 기인한 전지구 총 누적배출량을 제한해야 하는데, 즉, 총 탄소배출총량 내에 머물러야 한다. 산업화 이전 시기 이후 인간활동에 기인한 CO2 배출량은 1.5℃를 위한 총 탄소배출총량을 2017년 말까지 대략 2조2000억±3200억톤(tCO2)을 고갈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른 잔여배출총량은 현재의 배출 수준인 연간 420±30억톤(tCO2)씩 고갈되고 있다. 전지구 온도 측정방법의 선택은 잔여 탄소배출총량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제 5차 보고서와 동일하게 전지구 평균 표면 기온을 사용하면, 50% 확률로 1.5℃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경우 잔여 탄소배출총량은 5800억톤(tCO2)로 추정되고, 66% 확률일 경우는 4200억톤(tCO2)로 추정된다. 대신 GMST를 사용할 경우 50%와 66% 확률일 때의 추정값은 각각 7700억톤(tCO2)와 5700억톤(tCO2)이다.
-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에서는 에너지, 토지, 도시 및 기반시설(수송과 건물 포함)과 산업 시스템에서의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속도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나, 규모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모든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대폭 감축, 감축 수단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감축 수단에 대한 상당한 투자 증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모든 경로에서는 탄소흡수(CDR)를 사용하여 21세기 동안 대략 1000억~1조톤(tCO₂)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흡수는 남은 잔여 배출량을 보상하고, 대부분의 경우 온도 정점 이후 지구 온난화를 1.5℃로 되돌리기 위한 net negative 배출량을 달성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에너지와 토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단기 배출량 감소 및 이를 위한 조치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및 탄소포집저장(BECCS) 없이도 이산화탄소흡수 확대를 수백 GtCO2로 억제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퇴치 노력 차원의 전지구적 대응 강화
- 파리 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감축 목표의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성과 추정치에 따르면 2030년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520-590억톤(CO2)에 달할 것이다. 2030년 이후에 배출량 감축 목표 및 규모가 매우 확대되더라도, 국가별 감축 수준을 반영한 경로는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에 대규모 탄소흡수(CDR)와 오버슛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전 지구 CO2 배출량이 2030년보다 훨씬 이전에 감소하기 시작해야 한다.
- 지구온난화 1.5℃ 경로에 상응하는 완화 옵션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걸쳐 다양한 시너지 및 상충과 연관되어 있다. 가능한 시너지의 총 수가 상충되는 수를 넘어서지만, 시너지의 순 영향은 변화의 속도와 규모, 완화 포트폴리오의 조합, 전환에 대한 관리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사회 및 시스템 전환과 변화를 지원하고, 보통 이를 이행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의욕적인 완화 및 적응을 달성하는 기후 복원력 있는 개발 경로의 추구를 지원한다.
참고문헌
- IPCC. (2018). Summary for Policymakers. In V. Masson-Delmotte, P. Zhai, H.-O. Pörtner, D. Roberts, J. Skea, P.R. Shukla, A. Pirani, W. Moufouma-Okia, C. Péan, R. Pidcock, S. Connors, J.B.R. Matthews, Y. Chen, X. Zhou, M.I. Gomis, E. Lonnoy, T. Maycock, M. Tignor, & T. Waterfield (Eds.),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pp. 3-24).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9781009157940.001 ↩︎